김홍렬 청주대·한국음식인문학연구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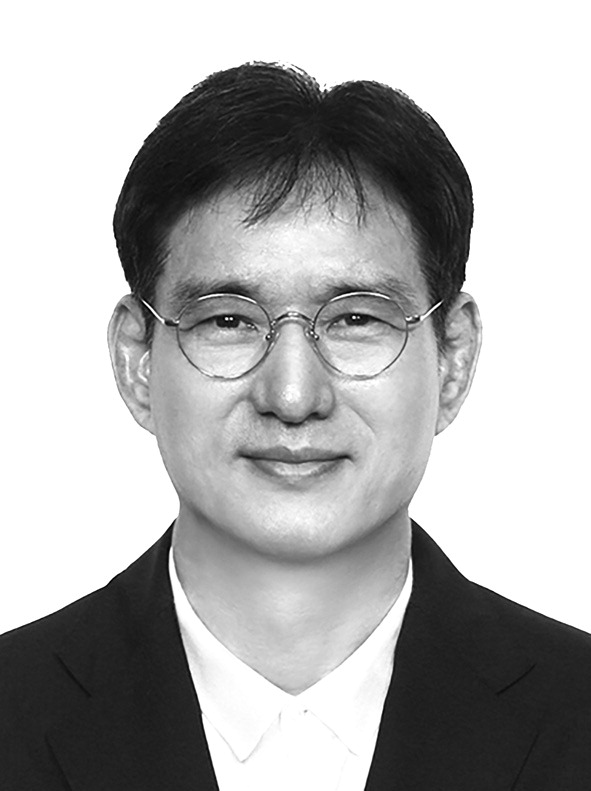
동춘당 종가의 음식을 찾아 대전역에 내리는 순간 아련한 추억 하나가 떠오른다.
시속 300km를 넘나드는 고속열차가 달리는 일이 있으리라고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1970년대 어느 여름의 일이다. 초등학생이었던 나는 방학을 맞아 어머니와 함께 삼촌집에 가게 되었다. 삼촌은 서울에 올라가 집도 사고, 자가용도 있고 그리하여 이제는 성공했다는 소문이 자자했던 분이다.
꼭 직접 찾아가야 할 무슨 사연이 있었는지는 여전히 기억에 없지만 당시는 특별한 볼 일 없이도 삼촌은 물론 문중 일가들까지 서로 찾아가고 신세 지던 일이 흔하던 시절이었다. 농사짓는 촌부였으나 호기심과 열정이 넘쳤던 어머니께서 막둥이 견문 넓히기를 핑계삼아서 서울 구경에 나섰던 것이 아니었을까?
어쨌거나 살이 튼실하게 오른 암탉 한 마리를 산 채로 묶고 두 홉짜리 소주병에 눌러 담은 참기름과 이런저런 농산물들을 보자기에 싸서 들고는 드디어 서울행 완행열차에 올랐다.
낯설고 소란스러운 열차 안 분위기에 지쳐갈 즈음 열차는 대전 역에 도착했다. 차창 밖으로 날카로운 호객소리가 들리고 이런 상황에 익숙한 듯한 중년의 남자들과 의기양양한 표정의 젊은 사내들 몇 명이 열차 밖으로 뛰어내렸다.
난 그때 가락국수를 처음 보았다. 굵고 매끄러운 면발의 낯선 음식이 궁금하기고 하고 배도 고파서 어머니를 바라보았지만 경비를 아껴야 하는 어머니는 끝내 내 눈을 외면하셨다.
돌아올 때도 마주친 경험을 통해 나는 대전 역에서는 다른 곳에 비해 열차가 좀 더 오래 머문다는 것과 그 막간을 이용한 가락국수 먹기가 열차 여행의 큰 즐거움 중 하나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유학 차 서울살이를 시작하고서야 가락국수가 일제 강점기때 일본에서 들어온 국수의 일종으로 원래는 우동이라는 이름으로 불린다는 것과 그 일본 우동이 사실은 한국에서 건너간 칼국수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일본인 우동 전문가의 고백이 있었음을 알게 되었다.
몇 대를 이어 온 집을 찾아 일본에 다녀올 만큼 우동을 좋아하지만 여전히 나에게 우동은 수십년전의 대전역이고, 가락국수이고, 어머니와 함께 탔던 그 혼돈의 완행열차이다.
대전역 근처 골목 어딘가에, 플랫폼에서는 사라진 그 가락국수에 추억을 함께 담아 파는 포장마차 하나쯤은 남아 있을 것만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