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인터뷰> "예쁜 딸 금방이라도 돌아올 것 같아"
지난해 대전서 음주운전 사고
대학 졸업 석 달 앞둔 딸 숨져
아르바이트 끝나고 집 가던 길
급작스런 불행에 가족 무너져
가해자 징역 11년, 처벌 가벼워
재범 가능성 커… 형량 늘려야
엄마 "음주운전 하지말라" 절규

[충청투데이 김성준 기자] "우리 딸, 오늘 대전에 비 온단다. 우산 챙겨서 나가."
임지안(가명) 씨는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하늘의 별이 된 딸 은경(가명) 씨의 휴대 전화를 보며 수시로 혼잣말을 한다.
딸이 돌아올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전화 속 날씨 어플리케이션에 은경 씨가 머물렀던 대전지역의 기상상태가 뜰 때마다 딸에게 말을 걸듯 중얼댔다.
임 씨는 "휴대 전화를 침대맡에 두고 전원이 꺼지지 않도록 수시로 배터리를 충전해주고 있다"며 "전화번호는 사라졌지만 전화 속에 딸의 흔적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항상 침대맡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비극은 지난해 10월 7일 대전에서 일어났다. 은경 씨는 이날 오전 1시30분경 서구 둔산동의 한 네거리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신호를 위반하고 돌진한 차량에 치여 숨졌다. 새벽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집에 가는 길이었다.
가해자 30대 남성 A씨는 은경 씨를 들이 받은 뒤에도 4㎞가량 도주하다 유성구 구암동의 한 도로 옆 가로수를 들이받고 경찰에 붙잡혔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204%였다. 임 씨는 잠결에 딸이 차에 치여 생명이 위급하다는 소식을 듣고 무작정 대전으로 차를 몰았다. 얼굴이라도 보기 위해 250㎞ 되는 거리를 질주했지만 딸은 이미 차가운 주검이 돼 영안실에 안치돼 있었다. 대학교 졸업을 석달 앞두고 닥친 끔찍한 불행이었다.
은경 씨는 임 씨에게 친구 같은 딸이었다. 매사 너그럽고 착한 딸의 성격 탓에 가끔은 딸에게 심적으로 의지할 정도였다. 대학교 재학 4년 내내 장학금을 놓친 적이 없었고, 외식사업부 마케팅 분야에 취직하기 위해 각종 자격증을 취득했지만 이젠 쓸모를 잃었다. 딸과 함께 보내던 소중한 삶은 한 주취자의 잘못된 선택으로 송두리째 사라졌다. 재판과정은 정신이 아득할 정도로 지난했다. 1, 2심을 거치며 가해자 얼굴을 볼 때마다 괴롭고 침울했다. 재판장에서 쪽지에 적어놓은 반성문을 무성의하게 읽는 가해자의 모습을 보면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가해자는 최종적으로 징역 11년을 선고받았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딸의 생명을 앗아간 것 치고는 박한 형량이었다.
임 씨는 "가해자가 수십㎞ 떨어진 충남 아산에서 술을 마시고 대전까지 차를 몰고 와서 사고를 낸 점을 보면 출소한 뒤 재범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면서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죽인 것은 흉기로 사람을 죽인 것과 마찬가지라고 본다. 11년형은 처벌 수위가 너무 약하다"고 토로했다.
임 씨는 딸의 첫 기일이 지난 최근에서야 간신히 유품들을 정리했다. 딸이 읽던 책과 직접 그린 그림 등 무엇 하나 소중하지 않은 물건이 없어 버리는 건 괴로운 일이었다. 그렇게 마음속에서 딸을 보내줬다. 그날의 후유증은 여전히 남아 있다. 가해자가 몰았던 흰색 카니발 차량을 볼 때마다 가슴이 덜컥 내려앉고 소름 끼쳤다.
임 씨는 연말 술자리를 앞둔 이들에게 운전대를 잡지 말아 달라고 간곡히 호소했다. 그는 "음주운전으로 누군가 사망하면 사망자뿐 아니라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평생 끔찍한 고통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달라"고 당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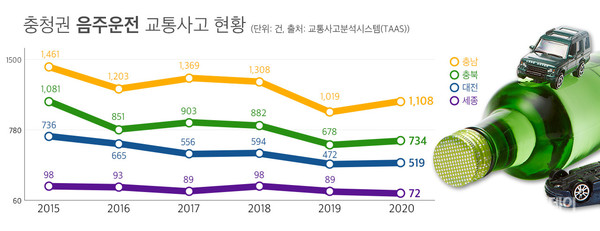
김성준 기자 juneas@cc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