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칭 노쇼, 전화·위조 공문서 제시 보이스피싱 유사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서 노쇼 사기는 미해당
경찰 요청에도 노쇼 범죄계좌 지급 정지 거절되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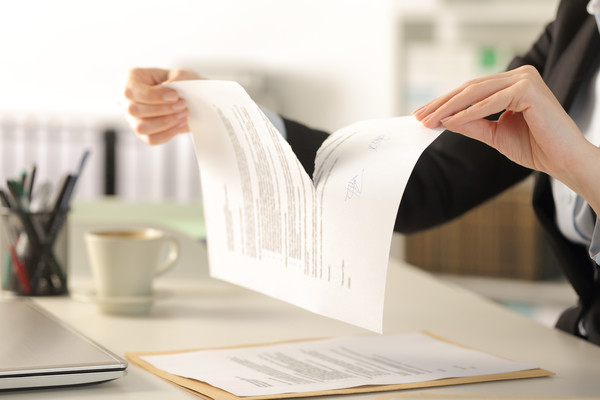
[충청투데이 김중곤 기자]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한 특별법이 마련됐지만, 최근 기승을 부리는 노쇼(계약 부도) 사기는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지난해 8월 시행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만연한 보이스피싱으로부터 시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발생한 피해에 대해선 신속한 회복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문제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서 다루는 전기통신금융사기에 공공기관을 사칭한 노쇼 사기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법령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전기통신으로 타인을 기망, 공갈해 자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행위라고 규정하면서도,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때문에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경우 특별법에 따라 112 신고만으로도 범죄 계좌의 지급 정지를 요청할 수 있지만, 노쇼 사기에선 불가능하다.
실제 최근 충남 홍성에서 충남도 직원을 사칭한 약 2800만원의 규모의 노쇼 사기가 발생했는데, 은행에서 범죄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홍성경찰서 관계자는 “고소인 조사 후 은행에 지급정지 공문을 보냈는데 계좌 전체를 막아야 하다 보니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 같다”며 “보이스피싱이면 바로 이뤄지는데 경찰 입장에서도 답답하다”고 했다.
대전경찰청 관계자는 “노쇼 대리구매사기는 전화를 이용하고 가짜 공문서를 만들어 군부대나 지자체를 사칭하는 등 기존 보이스피싱과 수법이 매우 유사하다”며 “하지만 보이스피싱처럼 범죄계좌 정지가 신고만으로 즉시 이뤄질 수 없다”고 지적했다.
기관 사칭 노쇼를 형법상의 사기 혐의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봉한 대전대 경찰학과 교수는 “기망만 했지 실질적으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하지 않으면 사기로 처벌할 수 없다”며 “또 의도성을 입증해야 하는 문제도 있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어려운 점을 악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이스피싱이든 기관 사칭 노쇼 사기든 시민의 소중한 재산을 위협하고 사칭된 기관에 대한 신뢰를 훼손한다는 점은 동일하다.
급증하는 노쇼 사기에 대응해 법체계를 정비하고 피해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은 “노쇼 사기는 가뜩이나 어려운 소상공인을 등쳐먹고 벼룩의 간을 빼먹는 파렴치한 범죄”라며 “경찰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과 관련해 유연히 적용하고, 정치권은 소상공인의 피해를 근절할 입법 보완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전경찰청 관계자는 “노쇼 대리구매사기는 사건 유형이나 수법, 사용된 전화번호, 사칭 기관, 이름 등을 종합해 적극적으로 병합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중곤 기자 kgony@cc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