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청원 10년전 그날]
통합따른 규모의 경제 실현 효과<3>
금융경제 8위… 한 계단 올라서
재정자립도 예상대로 9위 유지
서비스업 더 성장할 여지 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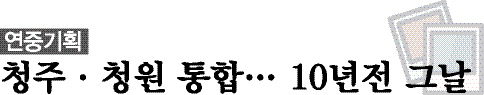
![10대 성과 목록[청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https://cdn.cctoday.co.kr/news/photo/202406/2197377_638966_3528.jpg)
[충청투데이 심형식 기자] ◆금융경제 9→8위
금융경제 분야 중 금융기관 예·수신 자료는 2014년과 2020년 데이터를 비교했다. 금융기관 수신은 9위가 예상됐지만 10위, 예금은 9위에서 8위로 한 계단 올랐다.
청주시의 예금총계는 2014년 9조 4110여억원에서 2020년 11조 2470여억원으로 늘었다. 대출총계도 12조 3330여억원에서 14조 6060여억원으로 증가했다. 예금과 대출총계의 증가세는 모든 비교도시에서 동일했다.
2014년과 2021년(일부 지역 2019년 및 2020년)이 비교된 지역 별 금융기관 수는 대부분 줄어들었다. 인구 감소 및 업무 자동화에 따른 오프라인 지점 감소 추세가 반영 된 것으로 보인다. 금융기관 수 감소는 특히 수도권 도시에서 뚜렷하게 나타났다. 수원시의 금융기관 수는 143개에서 123개로 20개, 성남시는 195개에서 154개로 41개가 줄었다. 청주시는 155개에서 143개(2019)로 12개 감소했다. 다만 비교 도시 중 충남 천안은 140개에서 177개(2019)로 37개, 전북 전주는 87개에서 91개(2019)로 4개가 늘었다.
◆재정 6→ 6위
6위로 예상됐던 청주시의 재정분야는 예상대로 6위가 나왔다. 청주시의 2014년 세입과 세출은 2조 3617억 9000여만원과 1조 8279억 4200여만원이었다. 2021년에는 세입 3조 9418억 2200여만원과 세출 3조 1647억 4300여만원으로 증가했다. 주요 비교도시 중 세출이 가장 높은 도시는 경남 창원시로 4조 1401억 9400여만원이었다. 세출에서 2위로 예상됐던 청주시는 증가액은 많았지만 수도권 도시들이 약진하며 순위로는 5위가 나왔다.
재정자립도는 9위 예상에 9위가 나왔다. 청주시의 재정자립도는 세입과목개편전 기준 2014년 36%였고 2023년에는 32.3%를 기록했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여수를 제외한 비교도시 모두가 재정자립도가 하락했다.
청주시의 지방세 징수액은 2014년 7941억 8000만원에서 1조 2564억 600만원을 증가했다. 예상순위는 7위였지만 6위로 한계단 올라섰다. 수도권에서도 수원, 성남, 용인, 고양의 증가액이 컸다. 지방에서는 비교도시 중 압도적으로 청주의 지방세 증가액이 컸다. 지방세는 법인지방소득세, 취등록세, 면허세 등으로 구성된다. 지방세 세입이 늘어나는 것은 경제규모가 성장했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 청주시의 1인당 지방세는 11위 예상에서 8위로 3계단 올랐다. 2014년 95만 5093원이던 1인당 부담액은 2021년 148만 769원이 됐다. 청주시의 지방세 징수액은 6위인데 1인당 지방세 징수액은 8위가 나온것은 청주시의 인구가 늘어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서비스업 약진 필요
전반적인 데이터를 비교해 봤을 때 청주시의 경제력은 긍정적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인구는 늘고 있고, 경제적으로는 안정적인 상황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실물경제에서 높은 성과를 보이고 있다. 제조업과 건설, 수출 분야에서 괄목할만한 성장을 하고 있다. 행정구역 통합의 첫 번째 장점인 ‘규모의 경제 실현’이 달성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전반적인 성장세 속에서도 예상보다 순위가 낮게 나온 지표는 우리나라의 수도권 집중 현상이 여전하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특히 2011년 당시 연구에서 제외됐던 경기도 도시 중 현재는 비교도시보다 더 성장한 도시도 있다는 점에서 국토의 균형발전은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다. 청주시의 경제상황만 분석했을 때 제조업의 강세는 유지해야겠지만 서비스업에서는 보다 더 성장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2022년 한국은행 충북본부가 발표한 ‘미시자료를 이용한 충북 자영업자 급감 현황 및 요인 분석’은 청주시가 경제적으로 추구해야 할 방향성을 제시해 주고 있다. 청주의 인구와 경제력이 충북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는 점에서 이 보고서의 정책적 시사점은 참고할 만 하다.
한국은행 충북본부는 보고서에서 충북 지역 자영업의 업황 개선 제약요인을 분석한 후 소비 활성화, 직주 불일치 해소, 신규 수요 창출 등의 수요기반 확충, 자영업 구조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끝>
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동부창고 야간 경관조명[청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cdn.cctoday.co.kr/news/photo/202406/2197377_638965_3349.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