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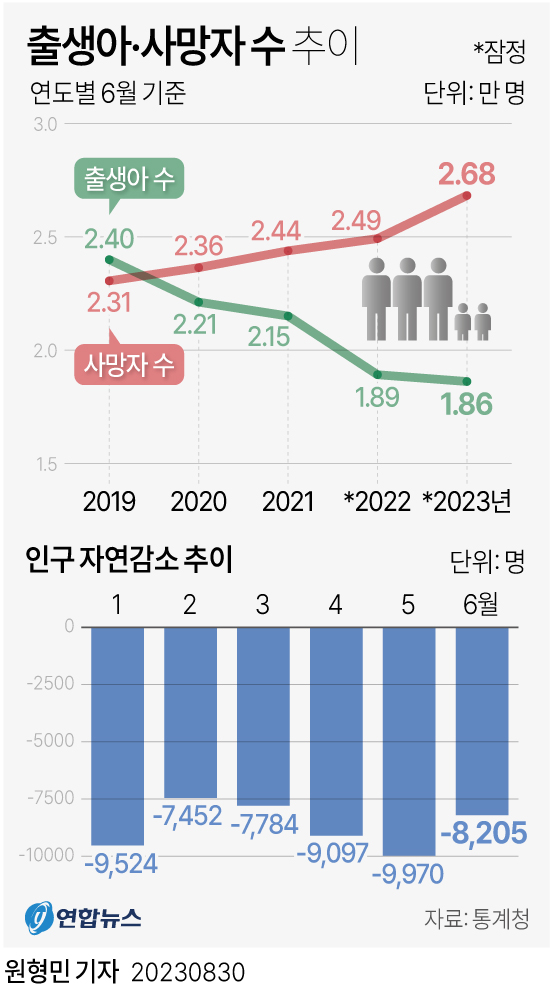
국가경쟁력의 척도인 인구수가 시군구 지역을 중심으로 급격한 내리막을 걷고 있다. 최근 한국고용정보원이 발간한 자료를 보면 사람이 없어 지도에 사라질 위기에 처한 ‘소멸 고위험’ 지역은 전국 228개 시군구 중 51곳에 이른다. 소멸위험지수로 분석한 위험지역 비중은 충남 80%, 충북 72.7%로, 충청권 대부분 지역에서 인구가 줄어 지방소멸 위기를 맞고 있다. 사실상 인구증가 요인이 없어 소멸 고위험에 처한 시군구는 충남과 충북 모두 5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지난해 처음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집행했다. 인구감소로 소멸 위기를 맞은 충청권 시군구 11곳을 포함해 전국 89곳과 관심 지역 18곳에 7500억원의 예산을 배분했다. 정부는 올해부터 2031년까지 매년 예산 1조원을 추가 투입해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문제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집행하는 지자체 사업 상당수가 기존 사업과 별반 차이가 없거나 실질적 인구증가 효과가 아닌 문화관광 콘텐츠 개발 등에 집중됐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매년 1조원 규모의 예산이 집행되고 사업평가에서 ‘S등급’을 받으면 최대 144억원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 탓에 전국 지자체 역시 내년 기금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투자계획에 대한 평가단계를 거치지만 사실상 전국 공모 형태로 진행되다 보니 ‘누가 더 많이 받나’라는 식의 무분별한 경쟁을 치른다는 지적도 있다. 정작 지방소멸 위기가 매우 높아 적극적인 대응사업이 시급한 지역이 아니라 소위 ‘숙제만 잘해서’ 높은 평가를 받거나 나눠먹기식 예산배분도 우려되는 대목이다.
인구감소 원인을 가장 잘 아는 소멸위기 지자체가 당장 시급한 정책을 찾아 내놓는 것도 좋지만, 그 정책이 얼마나 장기적인 실효성을 가질지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예산만 지원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정책의 면밀한 성과분석과 추적을 통해 실질적 인구증가 요인을 찾아내고 나아가 국가 인구정책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 지금의 인구문제는 국가 존망을 좌우할 만큼 중대한 과제라는 점에서 지자체를 넘어 정부의 주도적인 지역균형발전 정책도 함께 추진돼야 실효를 거둘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