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순 대전문인총연합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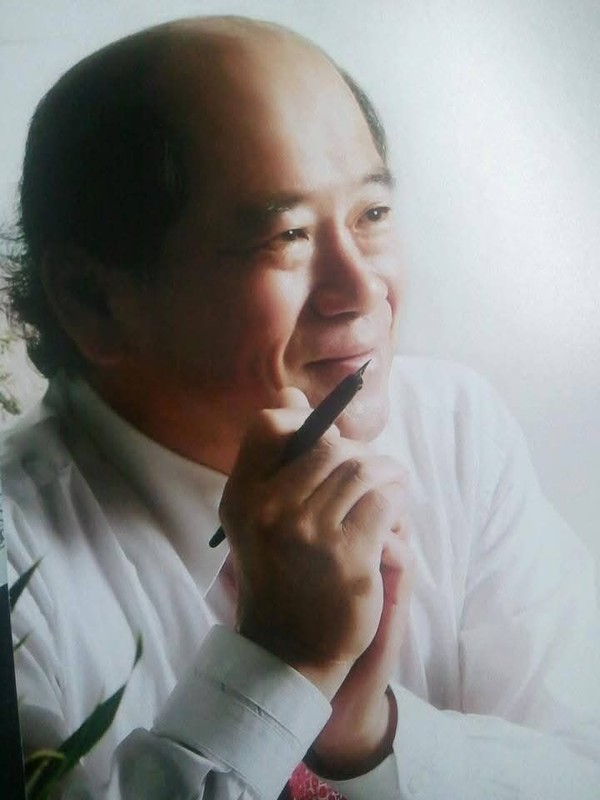
인공지능(AI)의 등장은 우리 사회에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모니터 상에서 이루어지는 업무는 AI의 도움으로 전에 없던 혁신을 맞이했다. 때로는 가상의 영역까지 확장해 인간의 상상력을 뛰어넘는 새로운 세계를 펼쳐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눈부신 기술 발전의 이면에는 인간 본연의 가치에 대한 깊은 성찰이 요구된다. 인간의 지능과 능력을 초월하는 데이터 처리 속도는 자칫 인간의 존엄성에 상처를 입히고 절망감에 빠뜨릴 수도 있다. 이미 많은 이들이 로봇 생산 라인에서 밀려나 노동의 의미를 상실한 실직자가 돼 존재 가치의 혼란을 겪고 있다.
인간이 존엄한 존재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존재 가치의 상실로 인한 우울감에서 해방되기를 바란다면 우리는 ‘신 인본주의 사회’를 꿈꿔야 한다. 노인 자살률이 세계 최고라는 비극적인 소식에 이어, 이제는 청년 자살률마저 최고조에 달했다는 뉴스가 들려온다. 시대적 난관을 극복하고 인간다운 삶의 의미를 되찾기 위해서는 시민 의식 전환이 절실하다. 다음의 몇 가지 제안을 통해 시민 사회 비전을 제시한다.
첫째 인류 공영을 위하는 ‘세계(詩民)’가 돼야 한다. 우리 민족이 오래도록 표방해 온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홍익인간의 정신과 맞닿아 있다. 시가 개인의 감정을 넘어 보편적인 인류애와 자연의 섭리를 담아내듯, 개인의 이익을 넘어 인류 전체의 번영과 조화를 추구하는 세계 시민 의식을 함양해야 한다.
둘째 종교와 사상을 초월해 통합을 위한 진리에 공감하는 시민이 돼야 한다. 집단 간의 문화적 차이는 때로 대결과 충돌을 낳을 수 있다. 시가 다양한 해석을 포용하듯, 우리 사회 또한 대결과 갈등을 넘어 화합과 상생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보편적인 가치와 진리 앞에서 하나 되는 지혜가 필요하다.
셋째 ‘나를 사랑하듯 남을 사랑하고 서로의 어려움을 위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사랑은 먼저 나 자신을 치유하고 돌보는 것에서 시작된다. 시는 남에게 보이기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쓰는 자기 치유 행위이며, 자아 정체성을 기르는 일이다. 내가 나를 사랑하고 이해할 때 비로소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고 진심으로 위로할 수 있다.
넷째 우주 안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을 사랑해야 한다. 시가 자연의 작은 움직임과 무생물 속에서도 생명의 경이로움을 발견하듯, 인간 중심주의에서 벗어나 자연과 모든 생명체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생태적 감수성을 길러야 한다. AI 시대의 기술 발전이 지구촌 모든 생명체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인공지능이 가져온 변화 속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고 새로운 희망을 찾아가는 길은 바로 우리 안의 ‘시심(詩心)’을 회복하고 ‘시민(詩民)’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데 있다. 기술의 발전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을 인간의 가치와 조화롭게 발전시키며, 사랑과 공감, 생명 존중의 가치를 확산하는 것이야말로 인공지능 시대의 진정한 사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