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렬 청주대·한국음식인문학연구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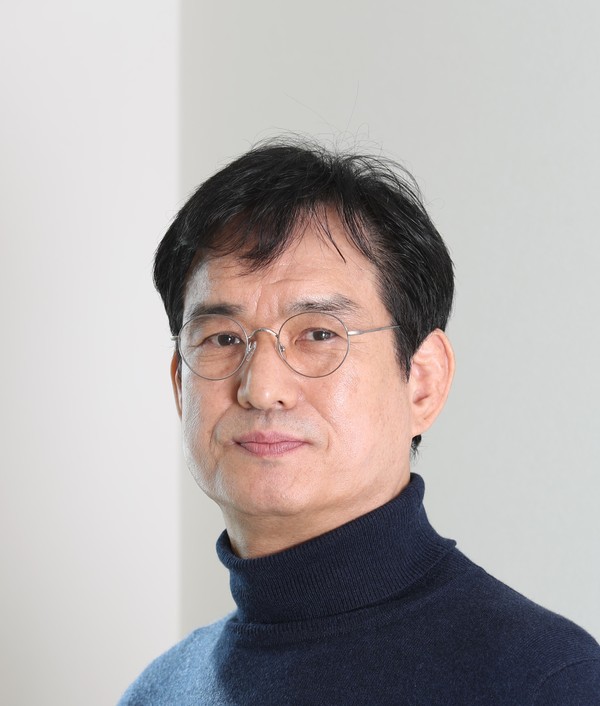
김장철이 되었다. 음식과 관련된 일을 하다 보니 여기저기서 김치 선물이 들어온다. 김치 제조업체거나 김치명인 아니면 음식 강의를 하는 분들이 만든 김치다. 전문가들이 좋은 재료를 써서 만들어 하나같이 품격이 있다.
아쉬운 것은 김치의 간이 맞지 않고 싱겁다는 점이다. 나트륨이 건강의 적이 되면서 김치는 나트륨 과다 섭취의 원흉이 되었다. 그때부터 김치가 싱거워지기 시작하더니 전통적으로 2도를 넘던 김치의 염도는 이제 1.5도 아래까지 떨어졌다. 관능적으로 인간이 채소절임 음식에서 가장 맛있게 느낀다는 1.7도보다 훨씬 낮은 수준까지 낮아진 것이다. 심한 경우 배추 샐러드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싱겁다. ‘음식 맛은 간 맞추기가 절반’이라고 김치 역시 간을 맞추는 것이 맛의 출발이다. 거기에, 젓갈을 넣어 감칠맛을 얹고, 발효의 산뜻함을 더해야 김치 본연의 맛을 갖는 것인데 소금과 젓갈을 확 줄여버리니 제대로 된 김치맛 보기가 어려워진 것이다.
먹을 게 귀하던 어린 시절 김장 김치는 겨울철 반년 동안의 귀한 식량이었으므로 우리 집 김치는 늘 짰다. 김치가 짜면 오랫동안 시지 않게 보관할 수 있을뿐더러 아무래도 먹는 양도 줄기 마련이다. 그래도 암갈색 젓갈을 달이고 바쳐 넉넉히 넣은 배추김치는 늘 최고의 반찬이었다. 짠 김치를 싱거운 밥과 함께 먹으면 짠맛도 줄어들고 감칠맛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이다.
냉장고와 김치냉장고가 대중화되고 텔레비전에 나온 유명한 의사와 영양학자들이 나트륨의 위험성과 김치 원흉론(?)을 제기하면서 당장 어머니의 김치부터 조금씩 짠맛이 줄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온 세상 김치가 싱거워져 버렸다. 간 맞는 김치 먹기가 어려워진 것이다.
11월 22일은 정부가 정한 ‘김치의 날’이다. 왜 그날이 김치의 날이 된 것인지는 모호한데 농림축산식품부의 설명으로는 하나하나(11)의 재료가 모여 22가지 효능을 갖는 김치를 상징한 숫자라 한다. 22가지 효능이 무엇인지도 분명하지 않을뿐더러 애초에는 열한 가지 재료로 만들어서 11이라 했으니 어차피 기억하기 좋은 날로 정해 놓고 나중에 억지로 꿰어맞춘 느낌이다. 사정은 이해가 되나 애초 전통적으로 김장철의 기준이었던 입동 날을 김치의 날로 잡았으면 어땠을까? 싱겁게 본래의 맛을 잃어가는 김치의 처지가 딱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