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안나(1994~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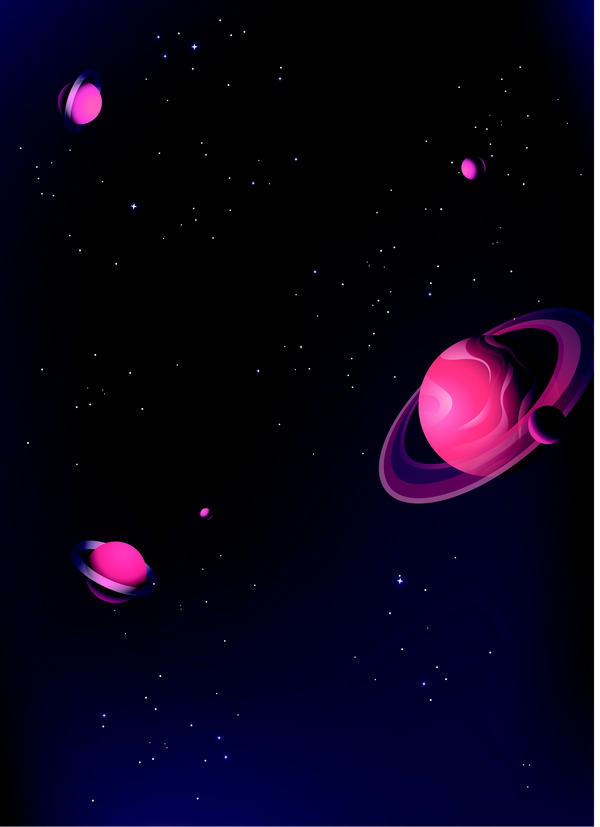
치약을 간신히 눌러 짠다
바둥바둥 입구를 비집고 나온 덩어리가
칫솔 위에 안착한다
완전히 쪼그라든 형태를 보며
열심히 살았구나 생각한다
내일 날짜가 적힌 몸뚱아리
유통기한은 소비기한과 달라서
숫자가 건조해진 뒤에도
며칠이고 몇 개월이고
사용할 수 있는 게 있다던데
본질에 유통기한이 있던가
가물가물해진 탓이었다
무뎌졌고
가물해졌고 뭉툭해졌다
동그라미가 되었다
곰곰이 힘을 써보면
아침까진 쓸 만할 것도 같다
우주가 된 기분이다
벽에 걸린 달력이 이제 달랑 한 장뿐이다. 한 해의 시한은 이제 마지막으로 치닫고 있다. 마지막 잎새로 남은 달력은 볼수록 우리를 긴장케 한다. 그러나 저 마지막 달력 속에도 또 12장의 달력이 들어 있다. 그렇다. 길이 그치는 곳에서 길은 다시 새 싹을 틔울 뿐. 시간은 언제나 흐르며 잠시도 멈추지 않는다. 초승달에 이르러 바닥을 비우고 다시 차오르는 달의 속살처럼. 고요한 명상으로 맑게 고이는 샘물처럼. 나뭇가지에 걸린 사슴의 뿔이 다시 자란다. 어느새 목욕탕 치약의 내부가 쪼그라들고 덮개의 날도 무디어졌다. 새롭던 날도 더 뭉툭해졌다. 그러니 다시 새 치약을 불러오는 것 아닌가.
벽지 속에 피어있는 꽃은 얼마나 슬픈가라고 노래한 시를 읽은 적 있다. 그렇지. 그건 피면서 곧 꺼져버린 꽃의 심장이 아닌가. 그건 피어난 꽃잎이 지기를 아주 멈추어버린 것일 터. 한번 피어서는 꽃이 영원히 질 수 없게 된다면 그건 얼마나 크나큰 형벌인가. 무거운 고통일까. 깊고도 깊어 아주 진한 공포에 빠진 것. 그 꽃은 피면서 곧 감옥 속에 스스로 가두어버린 게 아닌가. 그러니 시간이 정해져 있다는 건 얼마나 큰 축복일지. 시한부. 그래. 치약이 바닥 난 것은 그만큼 열심히 살았다는 증좌다. 언제나 본질에는 절대 유통기한이 없는 법. 아, 우주가 된 기분이다.
-김완하(시인·한남대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