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옥 수필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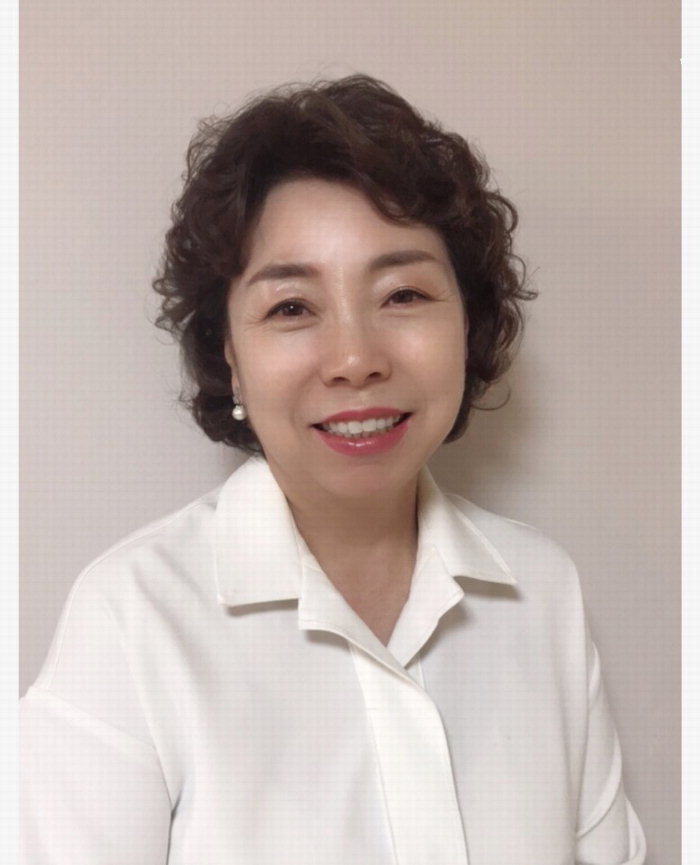
누군가에겐 그냥 하루이고 누군가에겐 흔적의 머뭄이다. 또 누군가에겐 간절한 기다림이고.
구름이 날아가는 바람찬 날에 창망하기 그지없는 동해 바다를 찾았다.
눈부신 햇살을 머금고 요동치는 웅장한 파도의 넘나듬에 망연히 시선을 빼앗긴다. 파도가 만들어놓은 포말들이 심연 속으로 스며드는 순간 내 정신과 몸속에서는 작은 세포들까지 일제히 깨어나 꿈틀댄다. 바다를 마주한 것만으로도 쿵쾅대던 심장은 더 크게 울렁거려 차디찬 해풍에 진정시키며 밀려오는 파도를 두 팔 벌려 흥건하게 맞이한다.
산산이 부서져 내려야만 한다. 그래서 다시 솟구치는 창해의 품안으로 온갖 시름과 탐욕을 순순히 내려놓을 수 있도록.
바다를 처음 보았던 때가 아마도 열 대 여섯 살쯤이었던 것 같다. 내륙에서 태어나 큰 강도 볼 기회가 흔치않던 그 시절에는 일부러 바다를 보러 간다는 건 꿈속에서나 그리던 일이다.
중학시절 여행길에서 처음 동해 바다 앞에 섰을 때 드넓게 펼쳐진 모래사장 앞으로 아득하니 끝을 알 수 없는 수평선을 보며 아찔한 현기증마저 일었던 것 같다. 철썩거리며 밀려왔다 밀려가는 푸른 파도는 모래톱을 들이받고 또 들이받을 때마다 거대한 물결의 일렁임이 덮쳐 올 것 같은 두려움에 꼼짝을 못하고 있었다. 황홀하게 낙조 빛을 머금은 바닷물 위로 뱃고동을 울리는 여객선이 망망대해를 향해 떠나가는 꿈은 그저 낭만적인 상상의 한 조각일 뿐이었다.
나이가 지긋이 들어서도 바다는 나에게 늘 동경의 대상이 되었다.
삶의 무게에 어깨가 눌려 주저앉을 것만 같을 때도 바다로 달려갔다. 허심하게 털어놓는 시름을 그냥 출렁이고 출렁대는듯하면서도 넓디넓은 바다는 야단스럽지 않게 품어주었다. 큰 파도의 물보라를 온몸에 맞으며 가슴에 응어리진 삶의 고뇌를 풀어 놓으면 깊은 속내에서 새롭게 꿈틀대는 생동을 분명 느낄 수 있었다. 때로는 무한하게 자애를 베풀던 어머니의 품속인 양 관대한 정이 전해져왔고 옥죄고 살던 시끄러운 마음들을 느슨하게 풀 수 있었다.
넓은 바다 앞에 서서 머릿속을 텅 비우며 하염없이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되곤 했다. 거센 숨결로 달려오던 파도도 산산이 부서지고 나서야 더 큰 물결을 긁어모아 다시 앞을 향해 달려 나갈 수 있거늘 해묵은 독선과 아집을 버리고 아량과 배려를 삶 중에 제일 크게 품으라 이르는듯 했다.
환상을 꿈꾸며 달려간 바다가 늘 평온하게 출렁이는 것은 아니었듯이 최고점을 향해 분분하던 일상의 꼭짓점에 섰을 때 꿈을 완벽하게 이루지 못했다 한들 그리 애달파하지 않으리. 성난 파도의 울림과 해풍을 흥건하게 온몸에 담고도 돌아오는 길은 언제고 아련하다. 마치 애가 타는 이별을 한 듯이. 바다는 아직도 나에겐 그리움이다. 동경의 출렁거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