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처럼 며느리처럼 환자와 4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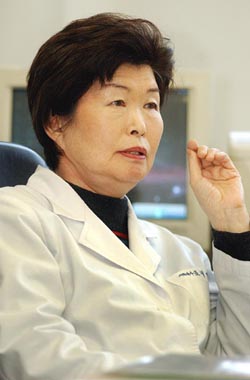
소문만복래(笑門萬福來), 웃으면 복이 온다.
복만 오는 것이 아니라 무공해 건강도 샘솟는다.
웃음만큼 명약이 없다는데 그는 40여년 전부터 그 명약을 아낌없이 퍼주고 있다.
서민들의 건강지기 생활이 고단할 만도 하련만 넉넉한 웃음도 모자라 아름다운 황혼을 만끽하고 있다고 만족해 한다.
대전 여성의원 1호
조내연(趙來衍·69) 박사는 의원을 폐업하고 잠시 일상의 잔잔한 즐거움을 누려 봤지만 중구 보건소 관리사의 명찰을 단 흰색 가운을 입고 환우들과
씨름할 때가 가장 편안하다.
그의 따뜻한 의술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말 그대로 '줄'을 서야 한다.
이런 저런 질병으로 그를 찾는 환자는 하루 평균 200~300명
선.
세월이 비껴간 듯 고운 얼굴과 근심 걱정을 말끔히 씻게 해 주는 밝은 표정은 보건소를 찾는 환자들의 아픔을 반감시키기에
충분하다.
특히 60~70대 할아버지들은 다른 관리사는 사절, 장시간 대기도 불사하며 그의 진료를 기다릴 정도로 최고의 팬이
됐다.
그에게서 의사는 사회적 명성도, 화려하게 포장된 지위도 아닌 봉사정신으로 무장된 직업인일 뿐이다.
1933년
전북 전주 출생인 그는 초등학교 시절부터 결핵으로 고생하는 오빠를 보며 의사의 꿈을 키웠다.
"아파하는 오빠를 보며 의사가
돼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늑막염 같은 잔병치레로 건강한 편은 아니었거든요."
2남3녀 중 금지옥엽, 막내딸에게 부모님은
힘껏 뒷바라지를 해 주셨다.
어린 소녀의 꿈은 6·25 전쟁 중 서울여자의과대학(이후 고려대와 통합)으로 진학하며 절반의 성취에
이르렀다.
"학부 1학년까지 부산에서 공부했습니다. 의대도 그렇지만 특히 여학생들은 손을 꼽을 만큼도 안됐을 때 아닙니까. 우리
동기들은 고집도, 주장도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강했어요. 무엇보다도 특권의식이 없었습니다. 요즘은 의사라면 무슨 대단한 감투를 쓴 것처럼
요란을 떨지만 말입니다."
천직이라고 믿었기에 공부가 힘들다고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서울 시내에서 재미있는 영화라도
상영할라치면 신세 한탄들을 하고는 했어요. '내 청춘은 기숙사에서 지는구나'하며 말이죠. 그래도 공부를 마다하는 친구들은
없었습니다."
학업에 쫓기면서도 미팅에 연애까지 조 박사는 시대를 한 걸음 앞장섰다.
부군 남공희(전 대전산업대 교수)씨를
만난 것도 한참 바쁜 학부 3학년 때의 일이다.
서울 적십자병원에서 인턴과정을 수료한 조 박사는 남편 남씨의 고향인 대전으로 둥지를
옮긴다.
1959년 11월 동구 중동에서 문을 연 부인의원은 대전에서 여의사가 개업한 최초의 의원이었다.
처음에는
시기와 차별이 적잖았다.
"여의사가 병원을 열었다고 하니까 산파가 조산원 개업한 것쯤으로 여깁디다. 무시와 폄하의 눈초리가 곳곳에서
환영인사를 대신하더군요."
결핵을 앓는 오빠에게 자극받았지만 병원 진료과목은 산부인과였다.
산부인과 여의사는 병원
문턱에서 주저하기 일쑤였던 산모와 가족에게 동질감과 안도감을 줬고, 병원은 문전성시를 이루며 개원 2년 만에 은행동으로 확장
이전했다.
그의 정성에서 빛의 세상에 안착한 생명을 셈하기란 쉽지 않다.
급한 마음에 채 병원에 다다르기 전에 택시
안에서 출산한 산모에게 달려나간 것도 한 두 번이 아니다.
제왕절개가 드물었던 시절, 난산하는 산모도 적잖았지만 결코 포기하거나
당황한 적이 없었다.
"아이 하나 받으면 온 몸이 땀으로 흠뻑 젖곤 했어요. 분만의 순간에는 산모와 한몸이 되는 것처럼 진이
빠지더군요."
무한경쟁 시대의 의료계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겠지만 지난 60~70년대 산부인과가 몰려 있던 은행동 병원동네에서는
의사간에도 품앗이가 있었다고 한다.
어려운 환자를 맞거나 급한 일이 생기거나 하면 이웃의 산부인과 선·후배 의사들이 득달같이 달려와
손을 보탰다.
"요즘 의사들 영리하고 실력도 뛰어나지만 환자와 의사의 신뢰나 환자에 대한 사랑, 사명감은 많이 쇠퇴한 것 같습니다.
특권의식도 지나치구요. 스스로 대단하다고 생각하며 보상을 기대하는 세태도 마음에 걸립니다."
환자들은 의사를 믿어줬고, 의사는
심혈을 기울인 덕분인지 부인의원 40년 동안 미미한 사고 한 번 없었다.
위기는 정작 그 자신에게서
비롯됐다.
부인의원은 개원한 지 얼마지 않아 대학 재학시절부터 친분이 두터웠던 이길녀(백병원 이사장) 박사가 미국의사 자격시험에
합격해 유학을 떠나며 그에게도 도전을 권유했다.
"욕심이 나더군요. 낮에는 진료하고 밤에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6개월이 지나
원서를 보냈는데 가타부타 말이 없는 거예요.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배달사고가 났더군요. 그 주범은 아직도 미스테리입니다. 그래도 후회는 없어요.
부인의원이 건재했으니 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부인의원을 개원한 지 얼마지 않아 대전·충남여의사회를 창립해 소수의 목소리를 담았던
조 박사는 적십자와 인연을 맺고 무의촌 진료나 청소년 감호소 등을 돌며 봉사의 의술을 실천했다. 바쁜 진료에도 학업의 끈을 놓지 않아 모교에서
레지던트과정을 수료하고 박사학위도 취득했다.
2000년, 무사고에 대한 감사의 마음과 이제 홀가분하게 봉사활동에 전념할 요량으로
부인의원을 폐업했지만 여행도, 지인들과의 수다도 유효기간이 그리 길지 못했다.
지난 2월 조 박사는 중구 보건소에서 원장이 아닌
평범한 관리사로 새 인생을 시작했다.
"정말 좋은 곳입니다. 봉사정신도 대단하고 이웃을 대하는 마음과 단합의 힘도
남다릅니다."
그는 믿는다. 의사가 밝아야 환자의 마음이 안정되며 열의를 다한 진료에서 아픈 이들이 안식을
찾는다고….
그는 말한다. "내 자신의 행복은 내가 가져야 합니다. 파랑새는 결코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