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우 포스텍 명예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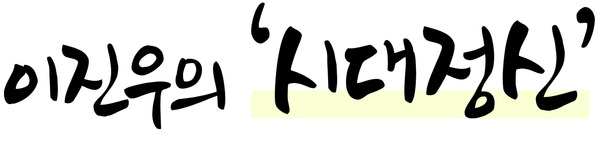

한국이 소멸한다. 지방이 소멸한다. 인구절벽으로 경제가 쇠퇴한다. 대학은 벚꽃 피는 순서로 망할 것이다. 파멸과 멸망이라는 극단적 용어로 표현되는 우리의 미래에 대한 비관주의적 전망도 끔찍하고 놀랍지만, 이러한 경종에도 별로 놀라는 것 같지 않은 태연한 태도에 우리는 더욱 경악한다. 모든 국민이 친숙하게 사용하는 ‘저출산 고령사회’는 이제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진다. 2006년 이후 17년 동안 ‘저출산’이라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380조원을 투입했음에도 합계출산율은 2006년 1.13명에서 2023년 0.72명으로 감소하고 있다. 그러니 사람들은 저출산을 이제 어떤 해법도 통하지 않는 우리 시대의 운명처럼 받아들인다.
도시화로 지방이 약화되겠지만 소멸을 말하는 것은 너무 지나친 게 아닌가? 한국의 인구가 줄어들겠지만 ‘한국의 소멸’이라는 종말론적 예언은 너무 과장 아닌가? 아니면 이러한 예측과 경고에 대한 우리의 무감각과 무관심이 오히려 지나친 것인가? 우리는 여기서 한국의 소멸을 경고한 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 로스 다우서트(Ross Douthat)의 사고 실험을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선진국에서는 여전히 여성 1인당 1.5명의 자녀를 두는데, 한국은 2018년에는 여성 1인당 자녀 수가 1명 미만으로 떨어진 이후 합계출산율을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다. 2023년에는 여성 1인당 출생아 수가 0.72명에 불과하다.
이렇게 출산율이 계속 하락하거나 유지되면 우리 사회는 과연 어떻게 될까? 한 세대를 구성하는 현재의 인원 200명이 다음 세대에는 70명으로 줄어들게 되며, 이러한 인구 감소는 "14세기 흑사병이 유럽에 몰고 온 인구 감소를 능가하는 것"이라고 한다. 이러한 추세가 계속되면 현재 약 5,100만 명의 한국 인구는 한 자릿수 수백만으로 감소할 것이라는 예측은 정말 종말론적이다. 설령 출산율이 개선되어 2060년대 말까지 인구가 3,500만 명 미만으로 급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추정치만으로도 한국 사회가 위기에 봉착할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인구절벽은 대한민국의 가장 큰 위기이다. 우리는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뉴욕타임스의 칼럼은 한국이 선진국을 엄습한 인구 감소 문제의 놀라운 사례라는 말로 시작하여, 한국의 현재 추세는 "단순히 암울한 놀라움 그 이상이며 이는 우리에게 가능한 일에 대한 경고"라는 말로 끝맺는다. 한국은 현재 세계의 선진국을 지배하는 ‘시대 정신’을 극단적으로 대변하고 있다. 우리가 저출산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대책을 세우려면, 21세기의 시대 정신이 저출산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이제까지 우리는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통계학적 변화를 주로 계량적으로 설명하고 그 원인을 주로 물질주의적 시각에서 찾았다. 어느 지역이 먼저 소멸하는지 지도를 그리고, 저출산 고령화가 어떻게 수도권 인구집중을 초래하는지, 학령인구의 변화로 대학이 어떻게 변화할지 계량적으로 예측하는 것이 거의 지배적이었다. 숫자와 지도만 보면 쇠퇴, 소멸, 몰락, 멸망과 같은 용어는 매우 당연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종말론적 시나리오와 수사법은 우리가 저출산과 인구 감소의 문제에 대처하는 데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 방송과 언론을 통해 오직 자극적으로만 묘사되는 이러한 진단은 오히려 저출산을 운명처럼 받아들이게 만든다.
그런데 저출산은 본래 사회 변동의 결과이자 징후이다. 사람들이 결혼과 출산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아이를 적게 낳거나 아예 낳지 않으려는 현상은 사회가 이미 변하였다는 징후이다. 사회가 변하였다는 것은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가치와 이상이 변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이렇게 저출산의 원인을 사람들의 가치관에서 찾는 방식을 ‘물질주의적 접근 방식’과 구별하여 ‘이상주의적 접근 방식’이라고 부를 수 있다.
예전에는 결혼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고, 결혼하면 당연히 얘 낳는 것으로 생각했다. 그런데 ‘결혼은 선택, 직업은 필수’라는 말이 인생 공식으로 굳어진 요즈음 ‘결혼했으니 애 낳아라!’는 말은 어불성설의 잠꼬대처럼 들린다. 통계청이 발표한 ‘한국의 사회동향 2023’에 따르면 결혼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20/30대 여성은 30%대에 그쳤다. 남성의 경우도 40%대로 급감했다. "돈도 없는데 무슨 결혼이에요?"라는 말은 결혼을 꺼리는 이유를 간단히 설명한다.
출산율 저하의 원인은 무엇보다도 자녀 양육비와 이에 수반되는 기회비용이다. 오늘날 MZ세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직장을 잃거나 소득이 감소하여 자신이 원하는 삶을 실현할 기회가 사라지는 것이다. 그렇다면 물질주의적 지원을 통해 출산율을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제까지 많은 사람은 북유럽 국가처럼 관대한 사회복지를 통해 출산과 양육을 물질적으로 지원하면 저출산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다. 그러나 2008년 이후 북유럽 국가의 출산율은 급락했다는 점은 인구 감소에 다른 원인이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사람들은 물질적 조건이 좋아졌음에도 출산율이 하락하는 원인으로 21세기의 시대 정신인 ‘개인주의’를 지목한다. 가부장적 권위주의가 여전히 강한 우리나라는 개인주의를 부정적으로 생각하지만, 사회를 구성하는 기본단위인 개인을 사회와 정치의 궁극적인 요소로 간주하는 개인주의는 사실 21세기의 보편적인 가치이다. 우리가 바라는 바람직한 사회는 모든 개인이 행복한 사회가 아닌가? 사회의 중심이 가족, 기업, 국가와 같은 집단에서 개인으로 옮겨가는 과정에서 개인주의는 필연적이다.
오늘날 젊은 세대의 개인들은 결혼과 출산 그리고 가족에 대해 기존 세대와는 전혀 다르게 생각한다. 그들은 자신의 삶을 위해 결혼과 출산보다는 직업과 노동을 선택한다. 이러한 ‘노동 우선주의’가 지배하는 한, 결혼한 직장인을 위한 ‘워라밸’ 정책만으로는 저출산을 해결하지 못한다. 결혼을 꺼리는 젊은 세대들에겐 일하면서도 가정을 가질 수 있다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개인의 생존이 보장될 때 비로소 행복한 삶을 위해 필요한 다른 가치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21세기의 시대 정신인 개인주의를 진지하게 생각해야 한다. 모든 개인이 자신과 같은 다른 개인인 자신의 아이를 바랄 수 있도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