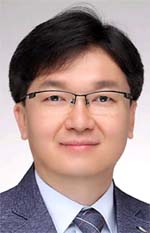
김하윤 배재대학교 주시경교양대학 교수
어느 마을에 도끼를 잃어버린 사람이 있었다. 이후 이웃집 총각을 수상히 여기면서 그의 걸음걸이와 행동거지 하나까지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총각의 조그만 행동에서 시작된 의심은 말투와 안색까지 번지면서 마침내 그가 도둑이라는 확신에 이르고 만다. 그러던 어느 날 골짜기에서 잃어버렸던 도끼를 찾게 되었는데, 그 뒤로는 이웃집 총각의 모습이 전혀 이상해 보이지 않게 되었다. 총각에 대한 의심이 걷히고 나니, 너무나 착하고 정직한 사람으로만 보였던 것이다. 이는『열자』에 나오는 '실부의린(失斧疑隣)'이란 이야기로, 타인을 한번 의심하기 시작하면 불신만 쌓이게 되어 결국 있지도 않은 귀신까지도 만든다(疑心生暗鬼)는 말이다.
우리도 한 번쯤은 가벼운 의심의 시작이 불러오는 위험성 징후(?)를 경험했을 것이다. 무심코 시작됐던 의심이 결국 머리의 사고까지 옭아매어 경과도 좋지 않은 것을 말이다. '의심할 의(疑)'자는 사람이 머리는 뒤로 하고 몸은 앞을 향해 서서 고개를 이리저리 돌리는 모양을 의미한다. 머리를 뒤로 하고 있다는 것은 좋지 않은 감정의 표현이요, 앞을 향하고 있는 것은 감정이 먼저 이루어지는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 자형(字形)에서 알 수 있듯이 머리와 몸이 서로 반대의 방향을 보고 있다는 것은 상대를 향한 불신의 마음이 의심의 형태로 드러난 것이다.
의심이 불신처럼 부정적 상황만을 불러온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긍정적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 학문이나 과학계에서 '와이(why)'라는 의심에서 출발해 이뤄낸 업적이 얼마나 많으며, 구체적이고 명확한 사실에서 기반하는 합리적 의심도 있지 않은가. 의심이 불러오는 긍정성도 당연히 인정하지만, 유독 인간관계에서는 접근 방법이 다르게 적용돼야 하지 않을까 한다.
결국 의심은 사람을 맹(盲)하게 만드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의심을 한다는 것은 불신이 싹트기 시작한다는 것이고, 불신이 커지면 눈이 멀어서 상대의 진면목은 보이지 않게 된다. 의심이 많은 사람은 상대를 보는 것보다 선입견과 편견에 먼저 빠져버리는 우(愚)를 범하기 때문이다. 결국 상대를 바라보는 판단은 흐리게 되고, 상대를 '인간의 비인간화'만 만들어버린다. 스스로 망(妄)한 사람이 되고 마는 것이다.
인간이란 단어가 '인생세간(人生世間)'을 줄인 말이라고 한데서도 알 수 있듯이 인간의 삶은 세상 사람들 사이에서 관계를 맺어가며 살아가는 고등 동물을 의미한다. 인간만이 관계의 형성을 통해 사회와 문화를 이루어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올바른 인간관계의 시작은 타인에 대한 의심의 장막을 걷어내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사람 사이의 믿음과 신뢰가 전제되어야 관계가 성립되며, 삿된 속인(俗人)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속인의 딱지를 떼고 고등 동물의 지위를 유지하고 싶다면 상대를 진실된 믿음으로 바로보아야 한다. 의심은 불신(不信)으로, 불신은 확신(確信)으로, 확신은 망신(亡身)으로 끝날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하지 않을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