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문화 신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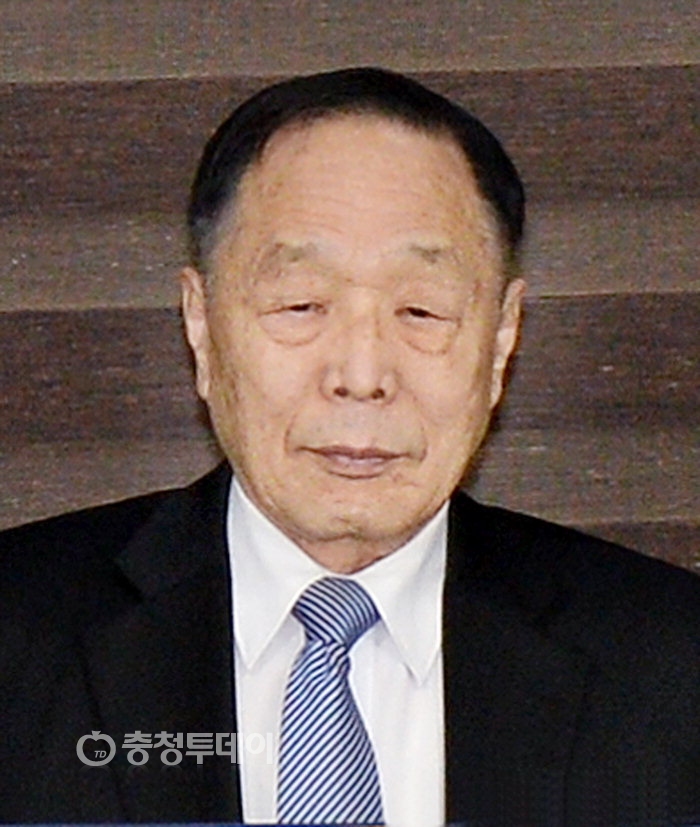
유종지미(有終之美)라는 사자성어가 있다. 이 말은 어떤 일이든지 시작했으면 마무리를 아름답게 잘 하라는 뜻이다. 우리들 모두가 생활속에 실천하면 좋은 세상을 만드는데 기여할 것 같은 좋은 말이다.
그런데 이 말의 쓰임새는 생각보다 다양해 어느 사람에게 사용돼도 어색하지 않게 들려진다. 예로 보면 유종의 미를 거둔다 혹은 거두도록 한다 또는 거둘 수 있겠다 등으로 자연스럽게 사용되기도 한다. 말하자면 대통령에게도 유종의 미를 거둬야 한다는 말을 할 수가 있고, 장관이나 국회의원 등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흔히 사용하며, 개업인사 중에도, 송·신년회 축배에서도 사용한다.
그 뿐만이 아니고 늙어가는 사람들끼리 나누는 말 중 하나이기도 한 것 같다. 나는 기독교의 개신교 목사로 41년간 일선 목회를 경험하는 동안 임종을 맞은 사람들을 많이 보았다. 세상만사가 천태만상이듯이 사람의 죽는 모습 역시 천태만상에 비유할 수가 있다. 그 중 몇 사람의 임종을 소개하며 유종지미(有終之美)의 의미를 상기하고자 한다.
내가 소개하고자 하는 첫 번째 임종자는 교회의 장노로 당시 연세가 육십넘어 칠십 미만으로 기억되는 분이다. 가족들과 내가 지켜보는 앞에서 부탁하는 유언(?)의 한마디가 동네 자전거포에 빵꾸(주부터진 것) 때운 것 500원 외상값을 갚아달라는 부탁을 큰 아들에게 하면서 잠들 듯 저 세상으로 갔다. 깨끗한 양심의 삶을 마감하는 장노의 죽음은 가족과 지인들에게 더욱 애석한 이별을 남겼다. 두 번째 임종자는 연세많은 권사님이었는대 침울하고 조용한 상가에 하루 동안 하얀 안개가 자욱하다가 걷혔다. 슬픈 분위기로 어두었던 상가는 가족들과 신자들의 찬송과 기도와 놀라움 그 자체였던것을 지금도 기억한다.
세번째 임종자는 암으로 죽음을 맞이한 칠십 정도의 남자 분른이었다. 연락받고 달려가보니 참혹하고 사나운 모습에 무섭기까지 했다. 뼈만 앙상하게 남아 기운이 없을 것같은 예상과는 달리 몸부림을 치면서 몸을 들먹거리며 괴음을 지르고 눈을 아래로 감았다 위로 치떴다 하면서 방안을 해매며 괴로워하다가 눈을 감고 늘어져 마지막 삶을 마감했다. 소름끼치는 것을 참으며 장례를 집례했던 일이 있었다. 그 분이 살아온 삶의 내용은 잘 모르지만 인간은 평소에 선량하게 살아야 된다는 생각이 지금도 뇌리속에 잠재해 사라지지 안는다.
유종지미(有終之美)적 삶이 필요하다는 것은 늙어 갈수록 가치있고 아름다운 삶의 마무리를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들기 때문이다. 올 때도 자의적 결정에 의한 출생이 아니였듯이 갈 때도 내 마음대로 갈 수 없다. 그런고로 생명의 마모(磨耗)가 중단되는 직전의 순간까지 부끄러운 늙음으로 자학하지 말고, 향기 가득한 은빛색갈 날리며 주름길 예술따라 유가치적 처신으로 늙으면서 피는 꽃을 연상해 봄이 어떠하실런지. 독자님들의 인생에 유종지미(有終之美)를 기원해 본다.
민상식 명예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