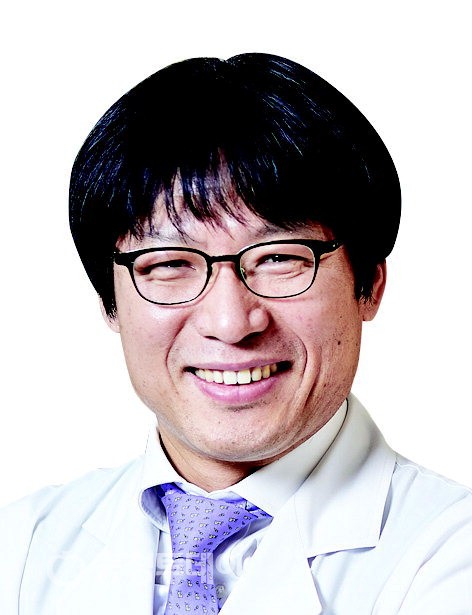
아픈 사람을 만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의사가 환자를 진료하는 것은 단순하게 병 자체를 다루는 것이 아니다. 병이 있는 사람을 대해야 한다. 종양을 다루는 외과의사로서 경력을 시작할 무렵에는 오직 병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 같다.
병이라는 것을 사람의 생명연장에 방해가 되는 절대악으로 반드시 제거해야 하는 그런 존재로 생각하고, 환자보다는 병이라는 것에 더 관심을 갖고 고민했다. 물론 환자에게도 나의 이런 생각을 설명하고 치료를 독려했던 것 같다. 생존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환자의 의견보다는 나의 방향대로 동의를 강요하기도 했던 것 같다. 환자를 돌보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병을 상대하고 있었던 것 같기도 하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병 그 차체에 대한 관심은 조금씩 줄어간다. 병에 대해서는 알 만큼 알았고, 치료 방법 또한 큰 틀에서는 크게 변한 것이 없다. 이제 조금씩 사람이 보이기 시작한다.
나쁜 소식을 어떻게 전해야 하는지, 또 다양한 환자의 반응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뭐 이런 것들이 요즘 진료실에서 많이 하는 고민이다. 그리고 투병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환자가 가지고 있는 병에 대한 생각도 정말 다양하다는 것을 느낀다.
병을 앓으면서 이제까지 몰랐던 것을 새롭게 알았다고 말하는 환자나 보호자를 많이 꽤 많이 본다. 병을 앓고, 가족이 더 화목해졌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몸보다는 마음에 더 큰 병을 얻었다는 사람도 있다.
간혹 니체의 말처럼, '사람이 병들었을 때는 그 사람의 선량한 부분까지도 병드는 법이다'라는 말이 실감날 때가 있다.
어쩌면 병이 꼭 나쁜 면이 있는 것만은 아닌 것 같다. 물론 의사로서 질병은 퇴치의 대상이다. 그것은 한번도 변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다.
막연하게 희망을 주자는 것은 아니다. 힘들어 하는 자에게 쓸모없는 동정을 보내자는 것도 아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 지라도 누구나 질병으로 아픈 순간은 오기 마련이다. 대부분의 환자들은 아팠을 때 가장 진실한 감정을 많이 느낀다고 한다. 왜 나만 이라는 피해의식, 끝없는 부정, 아닐 것이라 미련 등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제 조용하게 나를 되돌아보는 순간이 온다.
건강을 자신하던 내 자신이 한 없이 작아져 보여 어쩔 수 없이 겸손함을 배우기도 한다. 아무렇지 않은 신변잡기나 일상이 한 없이 소중하다는 것을 느낀다. 그냥 무심히 지나쳤던 과거를 뼈저리게 반성하기도 하고 병을 일종의 죄의식으로 받아들이기도 한다. 수술실로 향하던 침상에서 마지막으로 보던 가족의 얼굴이 평생 잊을 수가 없다고 한다. 잊고 살아 왔던 소중한 가치를 많이 깨우쳐 주는 것 같다.
'이제 병도 하는 일이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한다. 병은 최소한 사람을 생각하게 한다. 사람을 힘들게만 하는 병이 왜 있는지?라는 궁금증은 비단 우리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다.
폐암으로 투병하던 삼성의 창업주 이병철 회장은 타계 한 달 전에 가톨릭 사제에게 질문을 한다. '신이 인간을 사랑했다면, 왜 고통과 불행과 죽음을 주었는가?' 안타깝게도 고인은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지 못했다.
이 오래된 질문에 24년이 지나 한 신부는 이렇게 답을 한다. '고통과 불행과 죽음은 올바른 궤도를 찾기 위한 신호다.' 한번은 새겨봐도 될 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