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꽂이]
다시보는 고전-헤르만 헤세 ‘수레바퀴 아래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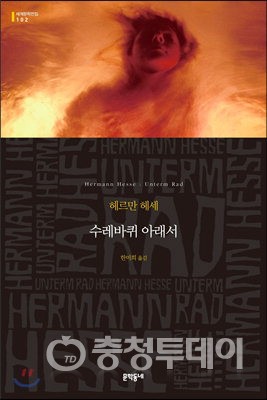
헤르만 헤세는 이 작품 ‘수레바퀴 아래서’를 1906년에 썼다. 지금으로부터 100여년 전이다. 하지만 주인공 한스 기벤라트의 모습이 왠지 낯설게 느껴지지 않는다. 하늘을 나는 자동차, 전신(全身)을 숨겨주는 투명망토. 시대의 기술은 비약적인 진보를 이뤘지만 우리는 여전히 한스처럼 수레바퀴의 그늘 아래 있기 때문이다. 불안한 열정과 미래. 방황과 좌절.
사회는 성공을 강조한다. 그리고 어느새인가부터 어른들 역시 아이들에게 ‘꿈을 꾸라’고 말해주지 않는다. ‘꿈’은 ‘성공’이라는 말로 대체됐다. 문제는 각자가 이룰 수 있는 성공의 모습은 너무도 다양한데 이를 인지시켜주는 이는 어디에도 없다. 똑같은 성공에 똑같이 매몰된 아이들이 찾을 수 있는 탈출구는 어디에 있을까. 결국 무게에서만 조금 차이가 있을 뿐, 모두가 한스처럼 똑같이 수레바퀴 아래서 신음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책의 줄거리는 이렇다. 주인공 한스는 조용한 시골마을을 빛내줄 공부 잘하고 말 잘 듣는 모범생이다. 모두의 기대를 받으며 사는 아이로 그저 열심히 공부해서 수석으로 학교를 졸업하고 목사가 돼 출세하는 것이 그에게 주어진 목표다. 그러다 ‘하일너’를 만난다. 그리고 깨닫는다. 출세와 명예가 자신의 텅 빈 마음을 절대 채워줄 수 없다는 것을. 이후 한스는 남이 만들어준 목표가 아닌 자신의 행복을 위해 꿈을 꾼다. 하지만 여태껏 그를 짓눌러왔던 수레바퀴의 짙은 그늘 밖으로 벗어나기란 쉽지 않다. 오히려 더 숨가쁘게 한스를 조여오는데…
분명히 생각해볼 문제다. 우리는 꿈이라는 설렘과 행복을 아이들에게 앗아가지는 않았는지. 이제 진실을 말해줘야 할 때다. 어디로 가든 좋다고. 그것이 비록 지름길이 아니어도. 조금 돌아갈지라도. 즐거움을 찾고 열정을 다할 수 있는 길이라면.
홍서윤 기자 classic@cc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