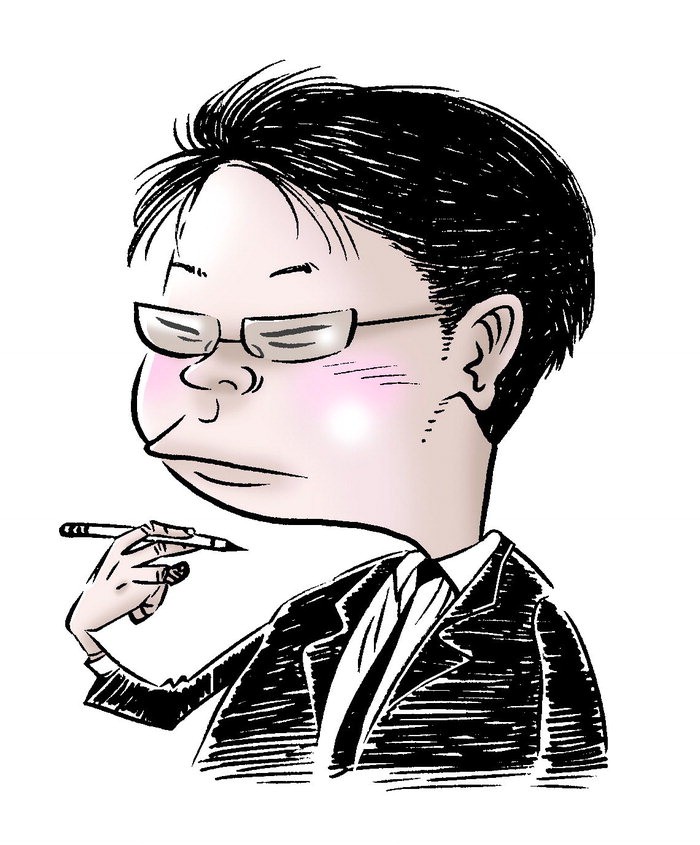
첫사랑, 정말 설레면서도 너무 서글픈 말이다. 설렘의 이유는 그때의 그 가슴 뜀을 아직 기억하기 때문이고, 서글픔의 원인은 결국 실패했기 때문이다.
필자의 첫사랑은 1997년 8월 비 냄새가 가득한 어느 토요일 찾아왔다. 서울 지하철 2호선 건대입구역, 어느 공중전화 부스 안에서 난 그녀를 기다렸다. 그녀는 하얀 블라우스에 검은 바지를 입고 한 계단 한 계단 내려왔고, 내 마음은 그 걸음걸이 보다 조금 더 빨리 내려앉았다. 그래, 그 순간이 '첫사랑'의 시작이었다.
행복과 슬픔을 겪고, 그만큼의 나이를 먹고, 그보다 조금 더 많이 가슴앓이 하고, 서로 조금은 다른 삶을 살던 어느 날, 그녀는 필자와의 술자리에서 고민을 털어놨다. "나 그 사람과 결혼해야 할까?" 필자는 적당한 시기고, 좋은 사람인 것 같다고 답했고 그녀가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모습까지 지켜봤다. 그날도 그녀는 아니 내 첫사랑은 아름다웠다.
'Too much love will kill you’라 했나, 그날 내 청춘의 한 조각도 종언을 고했다.
필자의 기억 속 '첫 선거'는 군대에서 부재자로 참여한 16대 대선이다. 당시 필자가 찍은 후보는 당선이 됐다. 아니 대통령이 됐다. 사실 필자는 그때까지 특별한 정치적 '색'이 없었다. 말 그대로 Case by Case(사례별로)… 뭐 그랬던 것 같다. 하지만 내가 '찍은' 후보가 대통령이 되어 그래도 무언가 바꿔보려, 더 좋은 세상을 만들려고 애쓰는 것(필자는 그렇게 생각한다)을 보며 지지하게 됐고 신뢰하게 됐다. 그래, 필자는 '친노' 혹은 '노빠'다. 하지만 이 정치적 '첫사랑'도 끝은 서글펐다.
2009년 5월 지금 생각해보면 필요이상으로 화창했던 어느 토요일 그는 떠났다. 너무 아픈 사랑이어서 인지, 무언가 나도 공범인지 모른다는 채무의식 때문인지 그가 그렇게 떠난 후 난 더 적극적인 지지자가 됐고 자연스럽게 '친노'에서 '친문'이 됐다.
여당인 민주당이 압승을 거둔 6·13 지방선거가 끝난 지 한 달이 좀 안 됐고, 당선인들의 임기가 시작된 지 일주일이 채 안 됐다. 그런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든다. 이미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된 첫사랑이 '부질없이' 문득 그립듯 내 정치적 첫사랑에 대한 미련이 지금의 대통령과 시장, 시의원 등을 선택하게 했을까. 어쩌면 그 '맹목적' 선택은 어느 날 후회와 반성으로 돌아오지 않을까.
그래, 어쩌면 그럴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선택은 이미 지나가 버린 일이고, 중요한 것은 앞으로다. 필자를 위해 아니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해 지난해 장미꽃 향기와 함께 온 대통령도 한반도 훈풍을 타고 온 시장도 '잘하길' 바란다. 아니 '제대로 하길' 부탁한다.
다시 한 번 선택의 순간이 왔을 때 또 다시 그 '첫사랑'을 기분 좋게 떠올리며 '지지'할 수 있게, 그것이 당당할 수 있게…. 아마 내 '첫사랑'도 그것을 바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