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과학저술가 앨런 버딕 '시간은 왜 흘러가는가' 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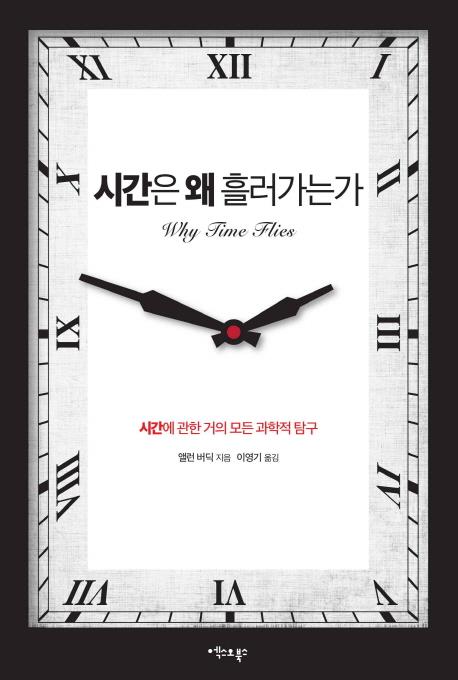
美 과학저술가 앨런 버딕 '시간은 왜 흘러가는가' 출간
(서울=연합뉴스) 정아란 기자 = #1. 1962년 프랑스 지질학자 미셸 시프르는 남부의 한 동굴에서 2개월간 동물처럼 살아보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동굴에 머무르면서 매일 기록한 달력 기준으로 35일째가 된 날, 시프르는 바깥세상에서는 목표 기간인 60일이 흘렀다는 전갈을 동료로부터 받는다.
#2. 은행에 강도가 들이닥치면서 긴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이 담긴 영상을 실험 참가자들에게 보여준 연구가 있었다. 참가자들은 영상 속 사건이 진행된 시간을 실제 시간보다 더 길게 느낀 것으로 나타났다.
신간 '시간은 왜 흘러가는가'(Why Time Flies)에 등장한 '시간'의 변화무쌍함을 보여주는 사례들이다.
시간(time)은 미국 영어에서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는 명사 중 하나이지만, 누구도 그 실체를 분명하게 알지 못한다. 째깍거리는 시계 속 바늘의 움직임만으로 시간을 규정할 수는 없다.
위 사례들처럼 상황별, 개인별로 시간은 다르게 흐르는 것처럼 보인다. 한 개인에게도 손목시계처럼 외부에서 인지되는 시간과 몸, 마음을 통해 흐르는 시간은 똑같이 맞아떨어지지 않는다.
'잃어버린 시간', '시간을 축내다' 등에서 보듯이 시간을 보다 구체적인 무엇으로 표현해보려는 비유가 많은 것도 그 때문이다.
'시간은 왜 흘러가는가'를 쓴 저자는 '뉴요커' 수석편집장 출신의 과학저술가인 앨런 버딕이다.
어릴 적 손목에 시간을 매어두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손목시계도 차지 않았다는 저자는 자신을 계속 끈질기게 따라다닌 궁금증, 시간의 본질이 무엇인지 조금이라도 알아내고자 10여 년간 시간을 추적했다.
저자는 프랑스 파리 국제도량형국, 미국표준기술연구소 등 시간을 가장 정확하게 측정하는 다양한 기관을 방문하거나 직원들을 만난다. 알래스카 북부의 기지에서 생물학자들과 2주간 시간을 보내면서 자신의 몸을 실험 대상으로 삼기도 한다.
시간을 둘러싼 다양한 실험과 연구, 철학을 망라한 이 책이 가장 주목하는 '시간'은 우리 몸속 시간, 즉 생체시계다.
우리 신체기관과 세포에는 많은 시계가 퍼져 있고 그 시계들은 서로 커뮤니케이션하면서 보조를 맞춘다. 근육세포, 지방세포, 췌장세포, 간, 허파, 심장 세포를 포함해 모든 인체기관이 자신만의 시계를 갖고 있다. 각자 리듬에 맞춰 째깍거리는 이 시계들의 지휘자 역할을 하는 것이 뇌 아래쪽 시상하부의 시교차상핵이다.
'시간의 노예'라는 표현에서 드러나는, 시간을 향한 현대인의 적대감을 꾸짖은 부분도 흥미롭다.
사회운동가 제레미 리프킨은 디지털 시대가 시작되던 때 "인류가 (디지털을 통한) 인공시간에 둘러싸이게 됐다"고 비판했지만, 기원전 2세기에도 로마 희극작가 플라우투스가 해시계 유행을 두고 "나의 하루를 비참할 정도로 토막토막 조각내 버렸다"고 독설했던 기록이 남아 있다. 컴퓨터와 스마트폰에 매인 삶의 양식이 문제인 것이지, 인공시간 자체를 비난할 일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이영기 옮김. 엑스오북스. 496쪽. 2만7천 원.
airan@yna.co.kr

